“작년 11월을 지울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버릴 수 있어요.”
일한 지 10년 차인 배테랑 요양보호사 A씨는 지난 22일 인터뷰가 시작되자 꺼낸 첫 마디는 “작년 11월을 인생에서 지워준다면 나는 이 목숨도 버릴 거 같아…”였다.
A씨는 지난 11월에 자신에게 있던 일을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악몽의 첫 시작은 전화 한통이었다. 발신자는 A씨가 일하고 있는 요양원이었다.
“이번에는 3일 근무할 준비를 해오세요.”
통상 하루 근무인데 이틀 더 근무하니 그에 맞는 짐을 싸오라는 소리였다. 그렇게 도착한 병원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요양원 내에는 이미 코로나19가 퍼졌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코로나19 확진을 줄줄이 받는 상황에서 확진자와 확진자가 아닌 환자들이 마구잡이로 섞여 있었다.
요양원은 A씨에게 방호복을 건넸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방호복을 입고 확진자와 확진자가 아닌 환자들을 구분해 그들의 침대를 끌고 병실을 옮겨야 했다. ‘이러다 나도 확진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방호복과 마스크를 믿었다.
그렇게 지옥 불을 끄고 내 안식처인 집으로 돌아가기 전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병원에서 대기했다. 그리고 곧 걸려온 전화는 A씨의 11월을 지옥으로 밀어 넣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이니 거기 가만히 계세요. 어디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어떨떨함도 잠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코로나 확진됐대. 엄마 짐 좀 챙겨줘, 그리고 통장은 장롱에 있고 통장 비밀번호는 1234야. 엄마 잘못되면 잘 챙겨.”
당시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때문이었을까? A씨는 코로나에 걸리면 죽는다는 생각 뿐이었다. 그렇게 ‘내가 무슨 죄를 지어 이런 병에 걸린거지? 내가 전생에 도대체…’라는 자책과 자괴감을 안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 까슬까슬한 일회용 병원복, 청소는커녕 악취가 올라오는 화장실. 그러나 살 수 있다는 희망에 열심히 약을 먹고 밥을 먹고 잠을 잤다. 그렇게 두 달.
“음성입니다.”
그렇게 한줄기의 빛이 내렸다. ‘아, 이제 끝이구나.’ 그러나 그 코로나19는 주홍글씨처럼 A씨를 따라왔다.
코로나 확진자였다는 기록이 이름처럼 따라붙었고 산재 신청을 해놓은 터라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소통하고 지내던 이들은 코로나 확진자였다는 걸 알자, 얼굴이나 보자 나중에. 라는 말로 기약없는 약속만 남발했다. 그렇게 위축됐다. 점점 곁에 사람은 없어지고, 숨 가쁨과 기억력 감퇴 등 후유증만이 A씨에게 남았다.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내가…”
그렇게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고 답답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런 그가 다른 묵직함이 또 나를 덮쳐왔다고 토로했다.
“4·16재단에서 나를 도와준다고, 그 큰돈을 나에게 준다고… 세월호참사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억은 하고 있지. 그런데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 곳에서 죄 많은 나를 또 도와준다고 하니까 가슴이 얼마나 무거워. 먹먹해 죽겠어. 그 돈을 어떻게 써.”
작년 12월 이후 재취업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실직 상태로 홀로 노령연금으로 근근이 살아오고 있었다. 잘 살아질 거라는 막연한 희망 속에도 추운 날 보일러 켜는 것도 멈칫거렸다는 A씨.
받은 돈을 어떻게 쓸 거냐는 물음에 A씨는 “이 돈 어떻게 써요… 못 써… 써도 좋은 일에 써야지. 우리 요양보호사협회 사단법인 만들 때 조금 출연하고 그리고 나 맛있는 거 조금만 사 먹을게,”
A씨 그렇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를 마지막으로 A씨는 “고마워요… 그렇게 힘든 일 겪은 사람들이 만든 곳에서 이런 나를 봐줘서, 정말 보잘것없는 나한테 선뜻 손 내밀어 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엄마·아빠들 내가 진짜 고마워. 노란색만 보면 이제 마음이 더 아련할 것 같아. 힘든 곳에서 핀 꽃이 날 웃게 만드네… 고마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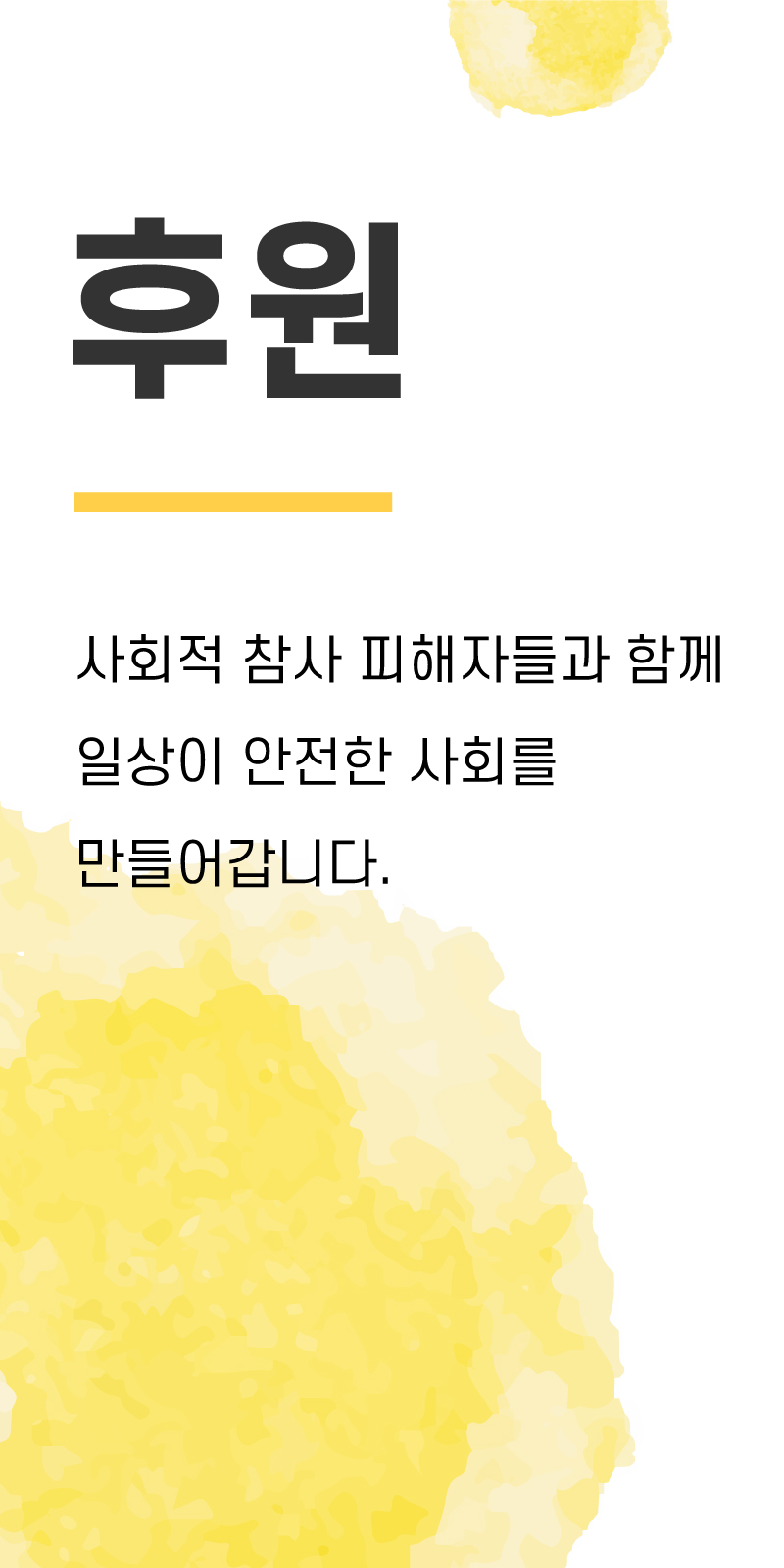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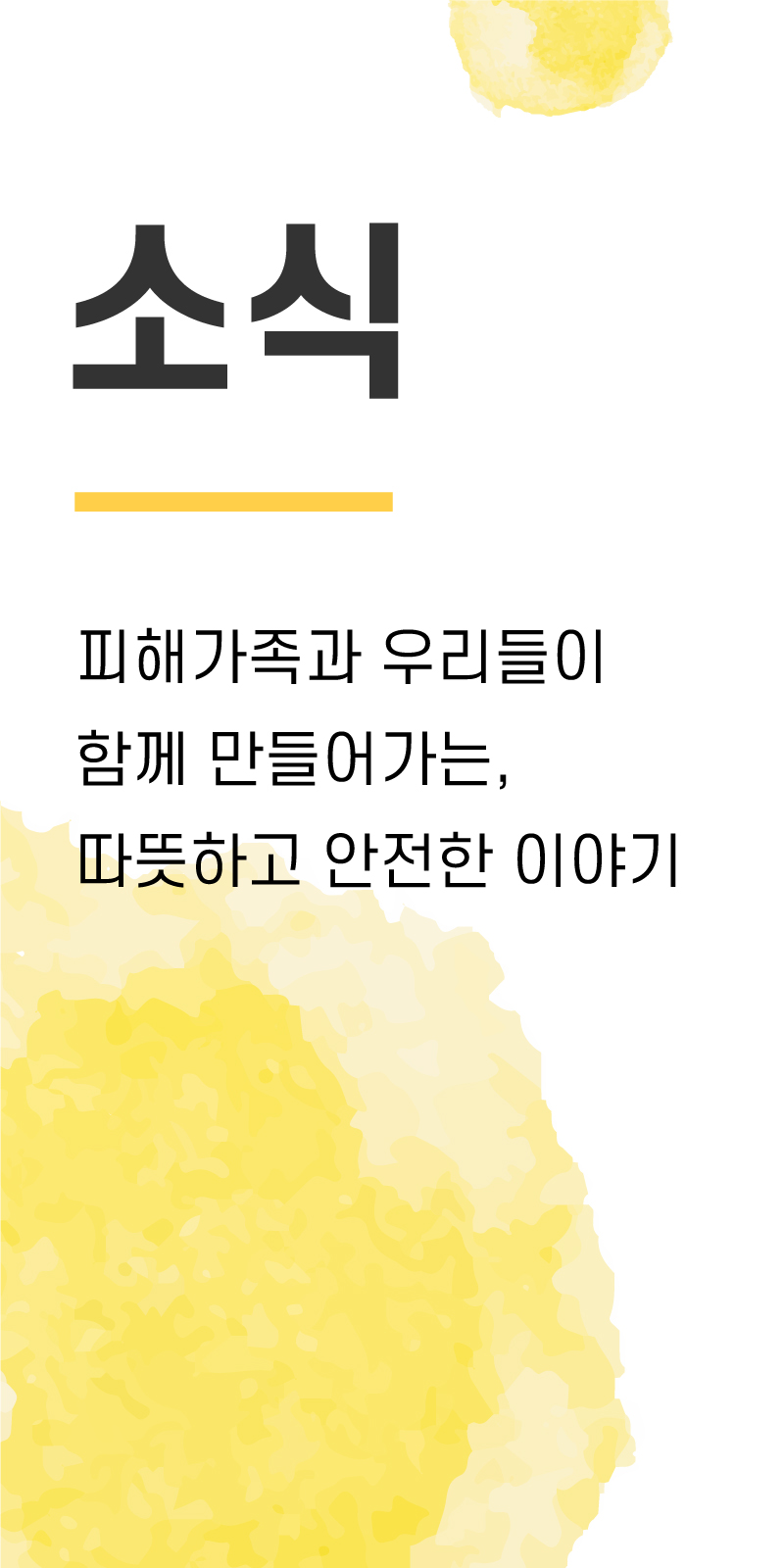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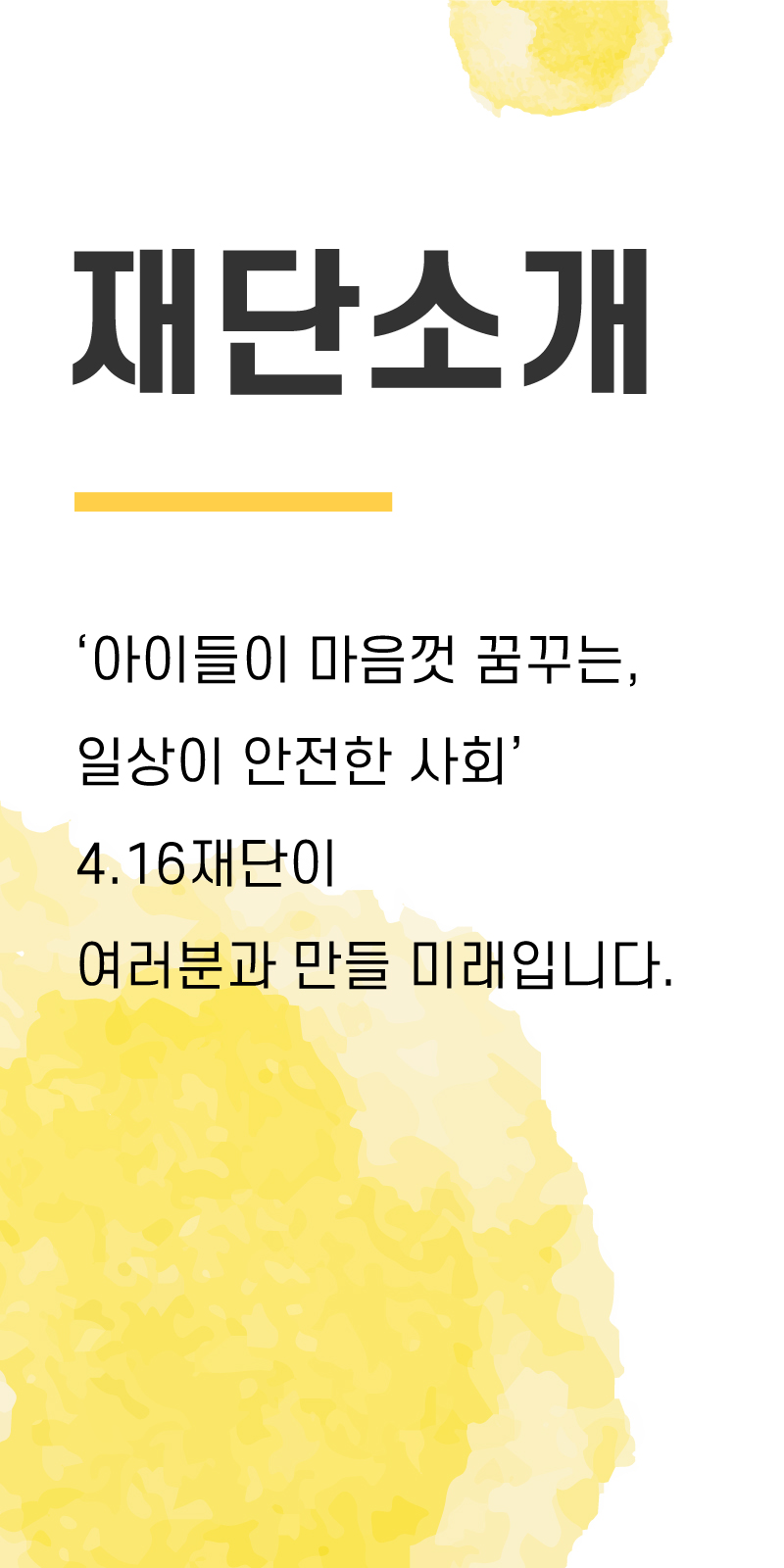


다른 소식들이 궁금하신가요?
활동소식
[4·16재단 청년 기자단 4기] 세월호참사 10주기 참사해역 선상추모식
활동소식
[4·16재단 청년 기자단 4기]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물품 특별전: 회억정원
활동소식
[4·16재단 청년 기자단 4기] 세월호참사 10주기 안산 기억식
활동소식
[4·16재단 청년 기자단 4기]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문화제
활동소식
[2024 「4.16의 봄」 오리엔테이션] 안전사회를 만들어가는 청소년·청년의 꿈을 응원합니다!
활동소식
[4·16재단 청년 기자단 4기] 세월호참사 10주기 4·16 언론보도 사진전시 ‘기억은 힘이 세지’
활동소식
[4·16재단 청년 기자단 4기] 금요일을 맞이하는 우리, [520번의 금요일] 북콘서트
활동소식
[4·16재단 청년 기자단 4기] 영화 <너와 나> 공동체 상영 및 세월호 가족과의 대화
활동소식
[4·16재단 청년기자단 4기] 세월호 참사 10주기 공식 기록집 북콘서트 <봄을 마주하고 10년을 걸었다>
월간 십육일 활동소식
[월간 십육일 – 정보라] 나의 세월호
활동소식
[4·16재단 청년 기자단 4기] 세월호 10주기 추모 음악회 ‘이제 바다는 내게’
활동소식
[4·16재단 청년 기자단 4기] 세월호참사 10년 ‘잊지않겠습니다’ 사진전
활동소식
[4·16재단 청년 기자단 4기] 4월 연극제 ‘언제나 봄+3650’ 그리고 ‘연속, 극’
활동소식
[4·16재단 청년 기자단 4기] 미디어아트 <그날의 봄을 기억하다>
활동소식
[4·16재단 청년 기자단 4기] 세월호 10주기 기록집 특별기획전시 <520번의 금요일 그리고 봄> : 어쩌면 새로운 질문과 마주할 당신에게
홍보 및 영상 자료 활동소식
?세월호참사 10주기를 앞두고 드리는 편지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홍보 및 영상 자료 활동소식
[2023년 4.16 안전문화 콘텐츠] ‘사라지지 말아줘’ 뮤직비디오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활동소식
[강일모 님] – 초고령 지역에서의 재난
월간 십육일 활동소식
[월간 십육일 – 김소영] 손이 닿는 곳
활동소식
[4.16꿈숲학교 상설강좌] 지구를 돌보고, 나를 돌아보는 겨울교실
홍보 및 영상 자료
4.16재단 2023년 사업소개 영상
홍보 및 영상 자료 활동소식
세월호참사 10주기 시민위원이 되어주세요
홍보 및 영상 자료
2023 시민 안전정책 제안 활동 지원 사업결과 보고회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활동소식
[이상민 님] – 재난은 찰나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활동소식
[세월호참사 10주기 문화예술공모사업] 10주기 추모전 ‘기억의 파도’ 개막식
월간 십육일 활동소식
[월간 십육일 – 김중미] ‘그날 고양이가 내게로 왔다’ 그 이후
활동소식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개소식 및 개소강좌] 우리함께, 손을 잡다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활동소식
[서하영 님] – 재난 현장에서는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활동소식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진행] – 재난피해자, 혐오 차별과 권리에 대해 말하다.
월간 십육일 활동소식
[월간 십육일 – 김지현] 지난하고 찬란한
활동소식
세월호참사 10주기, D-100 기억 다짐 기자회견
활동소식
[4·16재단 대학생 기자단 3기] 재난 참사로부터 배우는 안전권, 우리에겐 안전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