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십육일
x
강혜빈
시월의 월간 십육일에서는 2016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을 수상하고, 2020년 출간된 시집 <밤의 팔레트>로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은 강혜빈 시인님의 에세이를 소개합니다.
<등헤엄>
나는 평소에 물을 자주 마신다. 일어나서, 씻고 난 후에, 식사하기 전, 식사 중, 식사를 마치고 난 뒤, 그리고 때마다 종종, 잠들기 전까지. 아무런 맛도 나지 않는 맹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다. 하지만 벌컥벌컥 들이키는 일은 거의 없다. 그저 목을 축일 정도로만 마신다. 가끔은 컵에 따른 물을 물끄러미 본다. 자그마한 기포가 뽀그르르 피어오른다. 내 몸의 절반 이상은 물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지치지도 않고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이상하다. 나는 자주 물이 두렵고, 물을 보고 싶어 하는, 물에게서 도망치려 했지만 실패한, 물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날 이후, 한동안 물 보는 것을 두려워했다. 지평선이 아름다운 바다라든지, 수영장의 투명한 하늘빛 물. 마치 연한 묵처럼 멈추어 있는 밤의 호숫가. 하얗게 얼어붙은 강물. 티브이 속에서 송출되는 물. 물속을 찍은 사진마저도. 또는 어딘가에 담겨 있는 물. 고여 있는 물. 세차게 흐르는 물. 솟아오르는 물…… 언제 어디서든 물을 마주하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물을 바라보는 것을 지극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조금씩 슬픔이 걷히고, 침잠되어 있던 빛이 떠오를 때. 나는 천천히 물을 바라보기로 결심했다. 기억하는 마음을 깊이 간직한 채, 내일의 방향을 따라가기로 했다. 어느 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한 시간 동안 강물을 바라보고 있기도 했다. 그것은 버드나무가 이리저리 흔들리던 센 강이기도, 산토리니의 고요한 수영장이기도, 감색 노을 지던 블타바 강이기도, 이별한 사람이 떠오르는 한강이기도 했다.
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기억들이 저절로 딸려온다. 파도에 쓸려온 해초나 돌멩이처럼. 문득문득. 의도치 않은 장면들이 툭, 던져진다. 그 중 커다란 덩어리는 아빠의 것이다. 아빠와의 좋은 기억은 아주 어렸을 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한다. 조금 큰 이후에는 나쁜 기억 밖에는 없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따로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거의 없다.
내가 아이였을 때, 바닷가에서 몇 년을 지낸 적이 있다. 두꺼운 앨범을 펼쳐 보면, 커다란 물안경 쓴 아빠가 웃고 있다. 지금 내 나이쯤 되어 보이는 앳되고 흰 얼굴. 검은 머리카락. 커다란 북극곰 같은. 가지런한 이를 보이며. 조그만 나는 알록달록한 튜브 위에 누워 있다. 덜 조그만 나는 수영 모자를 억지로 뒤집어쓰고 있다. 사진 속에서 그는 대부분 물속에 있다. 목마를 타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파도는, 무섭고 아름다웠다.
영화 ‘문라이트’에서, 후안이 파도 속에서 샤이론의 몸을 지탱해주는 장면이 오래 남는다. 그 영화를 보면서 나의 시「등헤엄」을 떠올렸다. 그 시는 아픈 아빠를 생각하며 썼다. 오랜만에 만난 그에게 직접 보여준 시이기도 하다. 어릴 적, 아빠에게 수영을 조금 배웠는데, 그는 이상하게도 배영만 가르쳐주었다. 어설픈 배영을 시도하기 전에, 우선 물에 뜨는 법을 먼저 배웠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보며 물 위에 누워있으면, 나라는 사람이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몸의 힘을 빼는 일. 물의 선함을 믿는 일.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느낀다.
작년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이 수영을 알려주었다. 실제로 물속에 온몸을 뉘일 때까지 어떤 다짐이 필요했다. 그 사람이 프로 수영 강사라는 점이 마음을 조금 놓게 했지만, 막상 물을 마주하니 숨이 탁 막혔다. 나는 숨을 크게 쉬고, 용기 내어 물속으로 한 발자국을 뗐다.
“난 너무 많이 울어서 어쩔 땐 눈물로 변해버릴 것 같아.” *영화 <문라이트> 대사 중에서
304낭독회에 처음 간 것은 2015년 봄이었다. 대학에 다닐 때부터 대략 여섯 번의 낭독과 두 번의 일꾼을 했다. 그동안 어떤 것들은 바깥으로 드러났고, 어떤 것들은 여전히 가려져 있었다. 매번 노란 소책자를 가방에 구겨지지 않게 넣으면서, 눈물을 어디에 두고 나와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함께 말하고, 기억하고, 걸어가는 일. 마음 한 구석에 꼭 안고, 어떤 기도처럼 되새겼다. 늘 4월 16일이었다. 어느 날에는, 연희에서 낭독했다. 십대 시절, 일찍 떠난 친구를 떠올리며 쓴 시였다. 나무와 햇빛들이 함께 흔들리고 있었다. 내 차례에 새들이 크게 울어서 목소리가 작게 느껴졌다. 새들이 이상할 만큼 오래오래 울었다.
나도 새처럼 울고 싶다. 사실은 웃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그저 중얼거리고 있는지도. 나는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새로운 눈물은 만들어진다. 너무 아픈 이별과 너무 아픈 기억들은 별 일 없이 사는 사람처럼 잊고 지내는 척 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잊지 못했다. 앞으로도 잊지 못할 것이고, 잊지 않을 것이다. 다만 천천히 삶의 아름다움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고, 아무 생각 없이 웃기도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스스로 살아있는 사람인 것이 죄스럽게 느껴질 때. 다만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을 그리워할 것이다. 누군가를 끝내 기억하는 일에는 중력보다 커다란 힘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차가워지고 손등이 건조해지는 것을 보니 또 다시 가을이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한 이후, 달력에 노란 동그라미 스티커를 붙인다. 운동을 하지 못 한 날은 비워둔다. 거실 바닥에 요가 매트를 깔아놓고, 스트레칭을 하고, 플랭크와 스쿼트를 한다. 고작 내 몸의 무게를 버텨내는 것이 이다지 힘겨운 일이었다니, 여실히 느끼면서. 그리고 달력을 보고 알았다. 곧 아빠의 기일이 다가온다는 것을. 이렇게 사람의 기억은 무섭다. 너무 많이 울고, 너무 많이 슬펐던 작년 이맘때. 다시 선명해지는 어떤 축축함들. 그러나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나만의 방식으로 그를 애도해야지. 아무도 모르게, 당신을 매일 기억하고 있다고, 사실은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주어야지. 꿈에서라도 건강한 얼굴로 만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나는 밀려드는 세계를 박차고 나아갈 것이다. 내 안에 남아있는 지느러미를 다 쓰게 될 때까지.

Aboout 월간 십육일
월간 십육일은 매월 16일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에세이를 연재합니다. 다양한 작가의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주제의 에세이를 통해, 공함하고 계속 이야기해 나가자고 합니다.
*월간 십육일에서 연재되는 모든 작품들은 4·16재단 홈페이지, 블로그, 뉴스레터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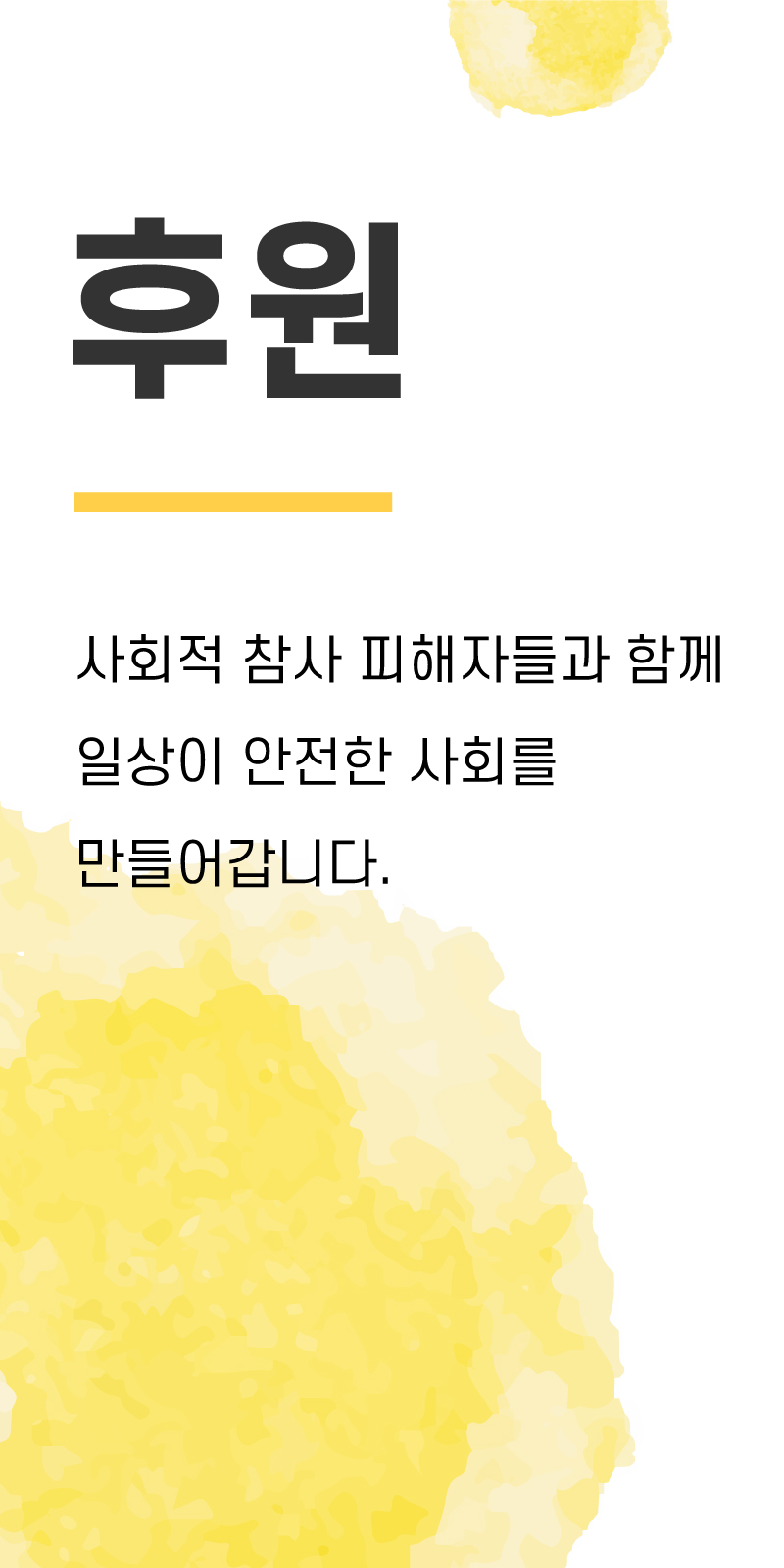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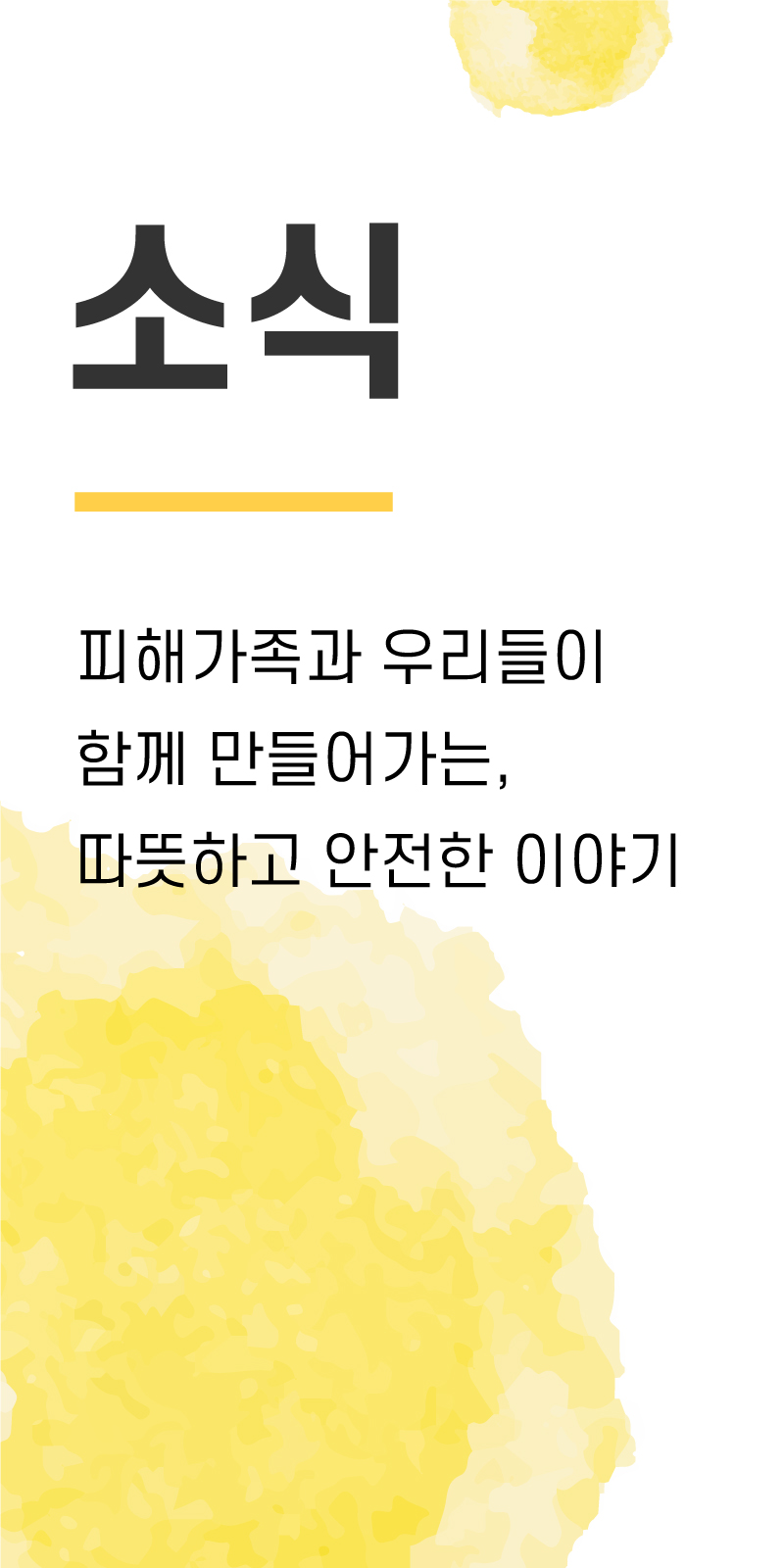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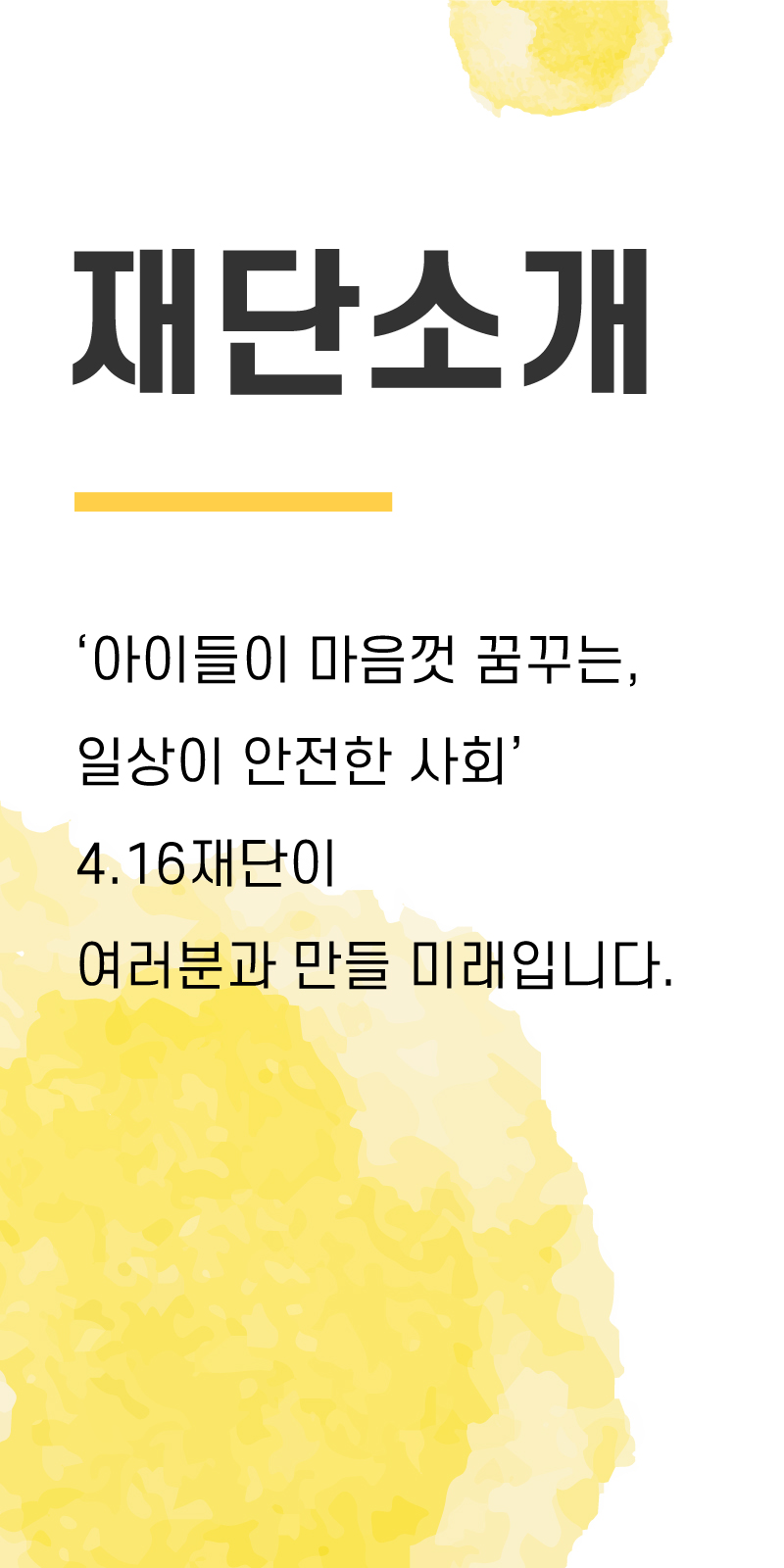


다른 소식들이 궁금하신가요?
활동소식
[4·16재단 청년 기자단 4기] 세월호참사 10주기 참사해역 선상추모식
활동소식
[4·16재단 청년 기자단 4기]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물품 특별전: 회억정원
활동소식
[4·16재단 청년 기자단 4기] 세월호참사 10주기 안산 기억식
활동소식
[4·16재단 청년 기자단 4기]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문화제
활동소식
[2024 「4.16의 봄」 오리엔테이션] 안전사회를 만들어가는 청소년·청년의 꿈을 응원합니다!
활동소식
[4·16재단 청년 기자단 4기] 세월호참사 10주기 4·16 언론보도 사진전시 ‘기억은 힘이 세지’
활동소식
[4·16재단 청년 기자단 4기] 금요일을 맞이하는 우리, [520번의 금요일] 북콘서트
활동소식
[4·16재단 청년 기자단 4기] 영화 <너와 나> 공동체 상영 및 세월호 가족과의 대화
활동소식
[4·16재단 청년기자단 4기] 세월호 참사 10주기 공식 기록집 북콘서트 <봄을 마주하고 10년을 걸었다>
월간 십육일 활동소식
[월간 십육일 – 정보라] 나의 세월호
활동소식
[4·16재단 청년 기자단 4기] 세월호 10주기 추모 음악회 ‘이제 바다는 내게’
활동소식
[4·16재단 청년 기자단 4기] 세월호참사 10년 ‘잊지않겠습니다’ 사진전
활동소식
[4·16재단 청년 기자단 4기] 4월 연극제 ‘언제나 봄+3650’ 그리고 ‘연속, 극’
활동소식
[4·16재단 청년 기자단 4기] 미디어아트 <그날의 봄을 기억하다>
활동소식
[4·16재단 청년 기자단 4기] 세월호 10주기 기록집 특별기획전시 <520번의 금요일 그리고 봄> : 어쩌면 새로운 질문과 마주할 당신에게
홍보 및 영상 자료 활동소식
?세월호참사 10주기를 앞두고 드리는 편지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홍보 및 영상 자료 활동소식
[2023년 4.16 안전문화 콘텐츠] ‘사라지지 말아줘’ 뮤직비디오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활동소식
[강일모 님] – 초고령 지역에서의 재난
월간 십육일 활동소식
[월간 십육일 – 김소영] 손이 닿는 곳
활동소식
[4.16꿈숲학교 상설강좌] 지구를 돌보고, 나를 돌아보는 겨울교실
홍보 및 영상 자료
4.16재단 2023년 사업소개 영상
홍보 및 영상 자료 활동소식
세월호참사 10주기 시민위원이 되어주세요
홍보 및 영상 자료
2023 시민 안전정책 제안 활동 지원 사업결과 보고회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활동소식
[이상민 님] – 재난은 찰나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활동소식
[세월호참사 10주기 문화예술공모사업] 10주기 추모전 ‘기억의 파도’ 개막식
월간 십육일 활동소식
[월간 십육일 – 김중미] ‘그날 고양이가 내게로 왔다’ 그 이후
활동소식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개소식 및 개소강좌] 우리함께, 손을 잡다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활동소식
[서하영 님] – 재난 현장에서는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활동소식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진행] – 재난피해자, 혐오 차별과 권리에 대해 말하다.
월간 십육일 활동소식
[월간 십육일 – 김지현] 지난하고 찬란한
활동소식
세월호참사 10주기, D-100 기억 다짐 기자회견
활동소식
[4·16재단 대학생 기자단 3기] 재난 참사로부터 배우는 안전권, 우리에겐 안전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