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뜻함이 배어있는 곳에서
지난 26일 오후 3시. 한바탕 퍼붓던 소나기도 그치고 햇살이 얼굴을 내비치던 그 시간 따뜻함이 배어있는 55극장에서 세번째 북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어둠 속 작은 빛.
독립 영화 상영을 주로하는 55극장은 자그마한 카페가 함께 붙어있었습니다. 곳곳은 책이 놓여 있었고, 마음 편히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차분한 분위기를 가진 공간이었습니다. 조금은 어두운 카페 곳곳에 밝은 전구 하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묵묵히 바닷속 등불을 자처했던 ‘민간 잠수사’처럼 말이죠. 그 공간에서의 기억을 기록해보고자 합니다.

먼 길을 와준 당신을 위해 우리는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독자들이 북 콘서트에 오는 길이 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먼 길을 걸어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온다는 것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결코 가볍지 않기에, 그 고마움을 알기에 김상우 잠수사님, 하규성 잠수사님, 시연 엄마 그리고 이 날 이야기를 풀어 갈 정유진 대구 4.16연대 집행위원이 미리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전한 당신의 일상을 위해
모든 이들의 안전한 일상을 기원합니다. 그렇기에 방역수칙 또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QR인증은 물론, 손소독과 방명록 작성,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 그리고 한 칸 씩 띄어 앉기까지.
“무엇보다 소중한 당신의 삶이 안전하길”


뜻 깊은 자리, 소중한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날 북 콘서트 진행에 앞서 대구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장혜진님과 박영수님께서 환영인사와 더불어 참여 소감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존경하다는 말, 무엇보다 당신과 우리는 함께라는 따뜻한 응원.
“정말 뜻 깊은 시간, 존경스러운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고맙고, 미안합니다.”

얘들아 엄마한테 가자, 아빠가 기다려.
나는 세월호 잠수사다 책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구조 현장을 묘사하는 것에 너무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잠수사들의 트라우마도 트라우마지만, 그날의 생생함을 전달해 혹여나 피해자들이 더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을까 걱정됐습니다. 절대 혼자 있는 아이들은 없었어요. 여러명이서, 꼭 안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위로한 채 별이 돼 있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혹여나 아이들의 몸이 상할까 엉켜있는 손을 하나하나 주물러가며 차가운 수온때문에 굳어버린 관절을 풀면서 잠수사들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며 아이들에게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얘들아, 따뜻한 곳으로 가자. 엄마한테 가자, 아빠가 기다리신단다.”

“아빠, 언제 또 다시 가?”
하규성 잠수사에게는 참사 현장에서 희생된 아이들과 동갑이던 딸이 있었습니다. 쿠웨이트 현장에서 산업 잠수사로 일을 하며 안정적인 삶, 딸내미들에게 부족할 것 없는 삶을 만들어주던 자랑스러운 가장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보도가 계속 될 수록 눈 앞에서 어른 거리는 딸들의 얼굴이 떠올라 구조 현장에 합류했습니다. 당시 희생자들과 동갑내기이던 작은 딸은 그런 아빠를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아빠, 너무 멋있어. 아빠가 진짜 자랑스러워.”
그 한마디에 세월호 참사 구조 현장으로 짐을 싸 내려갔습니다.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 현장은 열악을 넘어 참혹했습니다.
도착해서 마주한 건, 지칠대로 지쳐있는 선·후배들이었습니다. 너무 지쳐보였어요. 잠수라는게 산소와 단절된 공간으로 수압을 견디며 시간을 보내는 거라 오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안전수칙들과 잠수하는 동안 체내에 쌓인 질소를 감압해주는 챔버가 반드시 구비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챔버는 커녕, 안전수칙은 커녕, 끼니 조차 제대로 떼울 수 없었습니다. 맹골수도는 원체 조류가 센 바다라 자칫 잘못 들어가면 조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잠시 조류가 멈추는 그 시간, 우리는 교대로 바다로 뛰어들어야 했어요. 그게 점심이건, 저녁이건. 그런데 구조를 하고 나오면 해경과 해군은 자기들 배식 시간이 끝나면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발면 얻어 먹고, 한 날은 햄버거 8개를 던져 주면서 25명 잠수들끼리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보낸 구호 물품도 어디론가 사라지기 일쑤였죠.
우리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샤워시설도 없는 그곳에서 잠수복을 입은 채 생활했어요. 육지에 계시던 부모님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나봐요. 그래서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자신들에게 도착한 구호 물품을 다 같이 뒤져서 먹을 거 입을 거 고르고 골라, 보내셨다고 하는데, 우린 받은 적이 없어요. 앞서 말한 햄버거도 햄버거 만들어 보내주셨던 자원봉사자님은 200개를 보내셨대요. 그런데 우리 25명 잠수사들한테 도착한 건 8개였어요. 그게 정부였습니다. 그게 국민을 구하는 우리를 대하는 나라의 태도였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 이제야 이야기를 들어요.
사실, 처음 듣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어요. 잠수사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함께해줬는지, 어떤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데려왔는지 몰랐어요. 이 분들 역시 아프다는 걸 이제라도 알고 함게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정말, 나라도 버린 우리 아이들을 구조해주셨던 고마운 분들이에요.”

국가가 모든 걸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국가가 모든 것을, 모든 현장에 투입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에 민간 잠수사,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해야 하죠. 그런데, 나라라면서. 맞아요. 쓰고 버릴 순 있어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 불러다 이용하고 나몰라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고통을 주는 건 잔인해도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고소하고, 자기들의 실수를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고, 구조 현장에서 얻은 잠수병을 나라는 모른 척하기 바쁘고 치료 한 번 하려면 여기저기 구걸과 다를 바 없는 설명을 해야 하고, 그래놓고 우리가 몇 백만 원을 요구한다는 거짓말로 여론과 가족들을 선동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누가 구조하려고 달려가겠습니까?”

그랬던 잠수사님들이 계셨기에
우리는 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라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기에 4·16재단은 당신들과 붙잡은 손 꼭 잡고 함께 걷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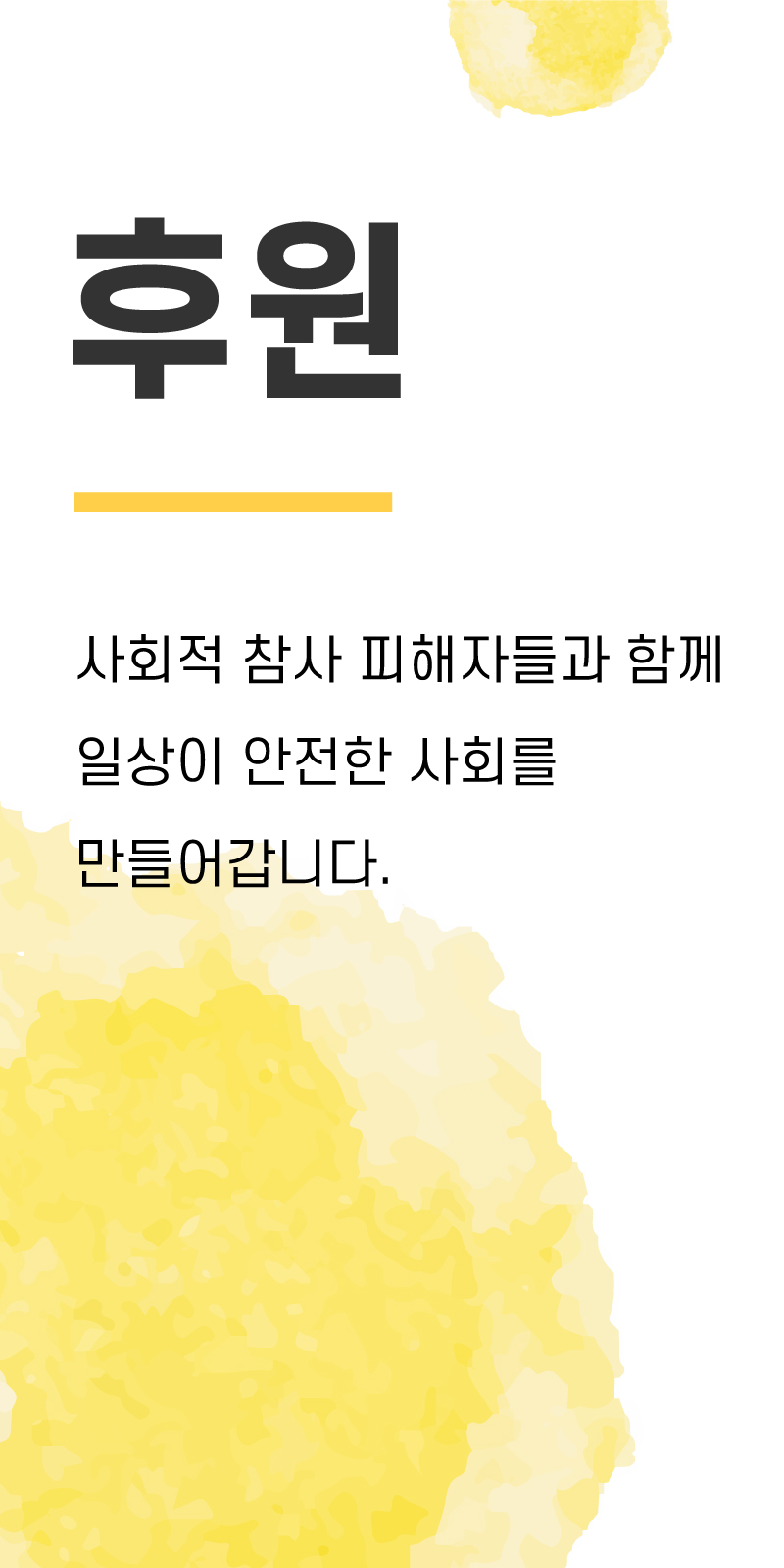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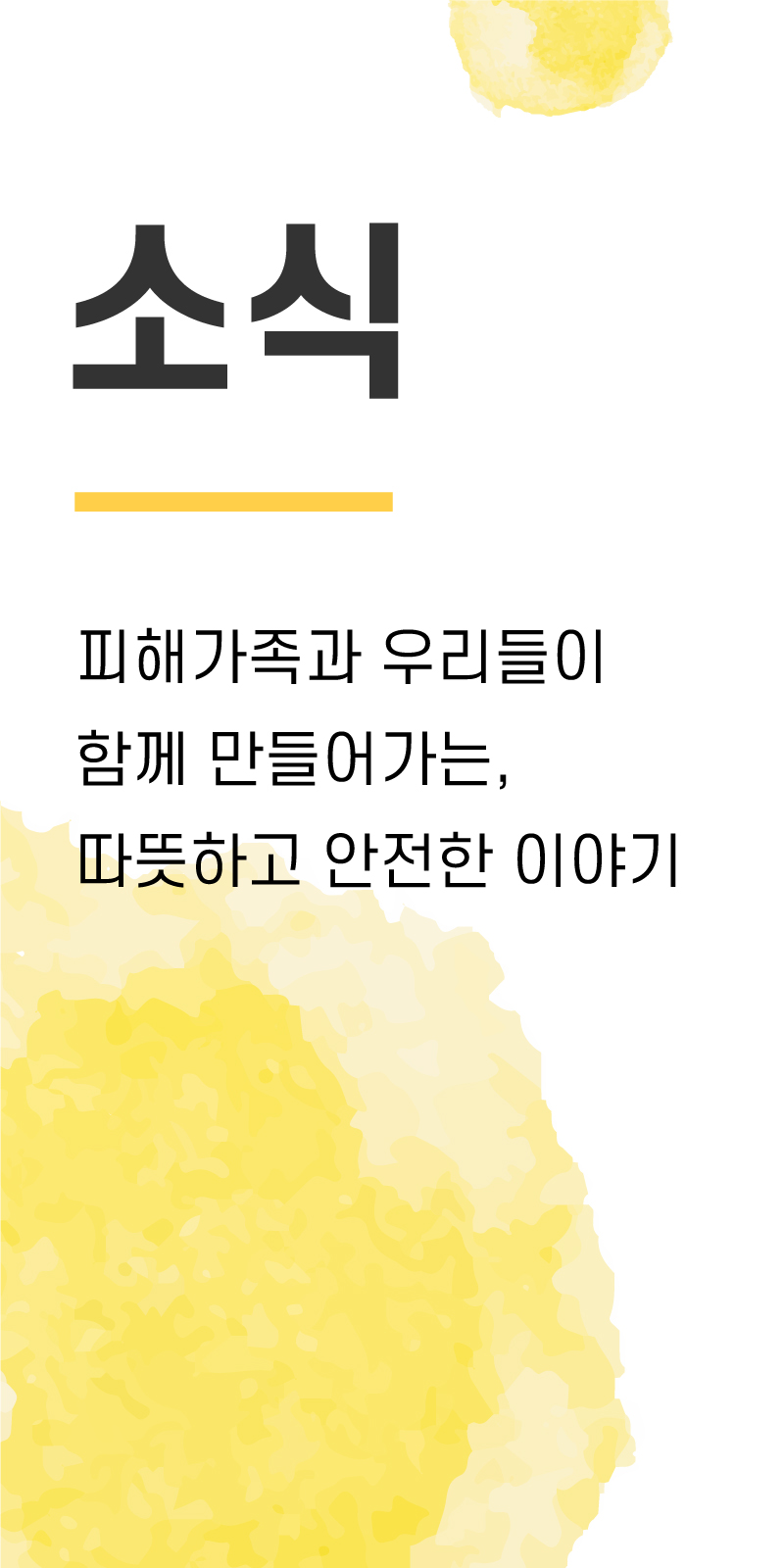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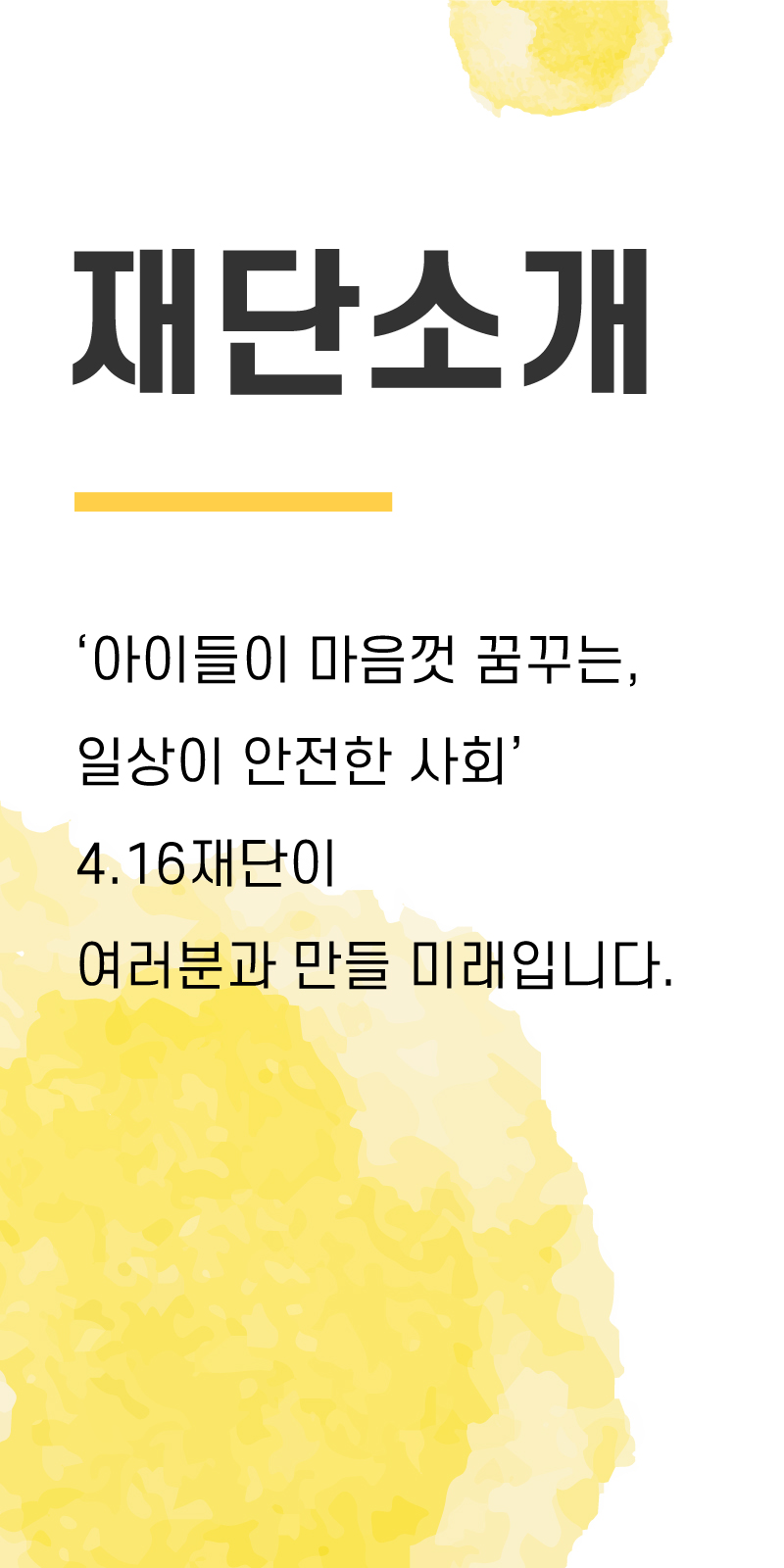


다른 소식들이 궁금하신가요?
활동소식
[4·16재단 청년 기자단 4기] 금요일을 맞이하는 우리, [520번의 금요일] 북콘서트
활동소식
[4·16재단 청년 기자단 4기] 영화 <너와 나> 공동체 상영 및 세월호 가족과의 대화
활동소식
[4·16재단 청년기자단 4기] 세월호 참사 10주기 공식 기록집 북콘서트 <봄을 마주하고 10년을 걸었다>
월간 십육일 활동소식
[월간 십육일 – 정보라] 나의 세월호
활동소식
[4·16재단 청년 기자단 4기] 세월호 10주기 추모 음악회 ‘이제 바다는 내게’
활동소식
[4·16재단 청년 기자단 4기] 세월호참사 10년 ‘잊지않겠습니다’ 사진전
활동소식
[4·16재단 청년 기자단 4기] 4월 연극제 ‘언제나 봄+3650’ 그리고 ‘연속, 극’
활동소식
[4·16재단 청년 기자단 4기] 미디어아트 <그날의 봄을 기억하다>
활동소식
[4·16재단 청년 기자단 4기] 세월호 10주기 기록집 특별기획전시 <520번의 금요일 그리고 봄> : 어쩌면 새로운 질문과 마주할 당신에게
홍보 및 영상 자료 활동소식
?세월호참사 10주기를 앞두고 드리는 편지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홍보 및 영상 자료 활동소식
[2023년 4.16 안전문화 콘텐츠] ‘사라지지 말아줘’ 뮤직비디오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활동소식
[강일모 님] – 초고령 지역에서의 재난
월간 십육일 활동소식
[월간 십육일 – 김소영] 손이 닿는 곳
활동소식
[4.16꿈숲학교 상설강좌] 지구를 돌보고, 나를 돌아보는 겨울교실
홍보 및 영상 자료
4.16재단 2023년 사업소개 영상
홍보 및 영상 자료 활동소식
세월호참사 10주기 시민위원이 되어주세요
홍보 및 영상 자료
2023 시민 안전정책 제안 활동 지원 사업결과 보고회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활동소식
[이상민 님] – 재난은 찰나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활동소식
[세월호참사 10주기 문화예술공모사업] 10주기 추모전 ‘기억의 파도’ 개막식
월간 십육일 활동소식
[월간 십육일 – 김중미] ‘그날 고양이가 내게로 왔다’ 그 이후
활동소식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개소식 및 개소강좌] 우리함께, 손을 잡다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활동소식
[서하영 님] – 재난 현장에서는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활동소식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진행] – 재난피해자, 혐오 차별과 권리에 대해 말하다.
월간 십육일 활동소식
[월간 십육일 – 김지현] 지난하고 찬란한
활동소식
세월호참사 10주기, D-100 기억 다짐 기자회견
활동소식
[4·16재단 대학생 기자단 3기] 재난 참사로부터 배우는 안전권, 우리에겐 안전할 권리가 있다
활동소식
다큐멘터리 [기억해, 봄] 시사회, 우리는 왜 기억해야 할까?
활동소식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발족식] 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 “아픔을 겪은 우리가 모였습니다. 안전한 세상을 위해!”
활동소식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방안
활동소식
[공동체 안전강사 양성사업] 2023년 강사 공동 워크샵
월간 십육일 활동소식
[월간 십육일 – 배수연] 레이스 뜨는 사람들
활동소식
[4·16 생명안전 웨비나 4] 재난 속 시민사회와 피해자 간 연대의 중요성